김영하,『단 한 번의 삶』
1. '김영하'라는 작가
김영하의 시칠리아 여행기, 『오래 준비해 온 해답』을 읽고 참 좋았다. 글에는 작가의 아날로그적 감성이 가득했다. 여행지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 잘 알려지지 않은 역사나 신화, 색다른 음식과 이국적인 풍경까지 생생했다. 지금 생각하면 스마트폰이나 구글 지도가 없던 그 불편한 시절, 전화나 지도만을 의지해 여행을 가야 했던 불편했던 과거에 대한 원초적 그리움이 글에 빠져들게 한 것 같다. 젊었을 때는 김영하 작가를 자기과시가 넘치고 쓰는 글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아류 같다고 폄하했던 적이 있었다. 뭘 안다고 그렇게 말했는지 내 자신이 옹졸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글에서도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수록 훨씬 평범한 면이 많은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자신이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게 도와준 '선한 운명'에게 늘 감사하는 사람이었다.
처음으로 소설 비슷한 것을 쓴 게 중학교 2학년 때였으니 사십 년, 여행은 삼십 년이 넘게, 스물다섯 살에 시작한 운전도 삼십 년, 마당을 가지게 된 게 2015년이니 식물을 가꾼 지는 구 년, 요리는 십칠 년이 되었다. 철들어서 처음 그림을 그린 것이 『랄랄라 하우스』삽화 때부터였으니 그림 그리기는 이십 년이 되었다. 나는 책도 수십 권을 두서없이 같이 읽는다. 이 책을 읽다가 저 책을, 저 책을 읽다가 또다른 책을....그래서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데 수년이 걸리기도 한다. p.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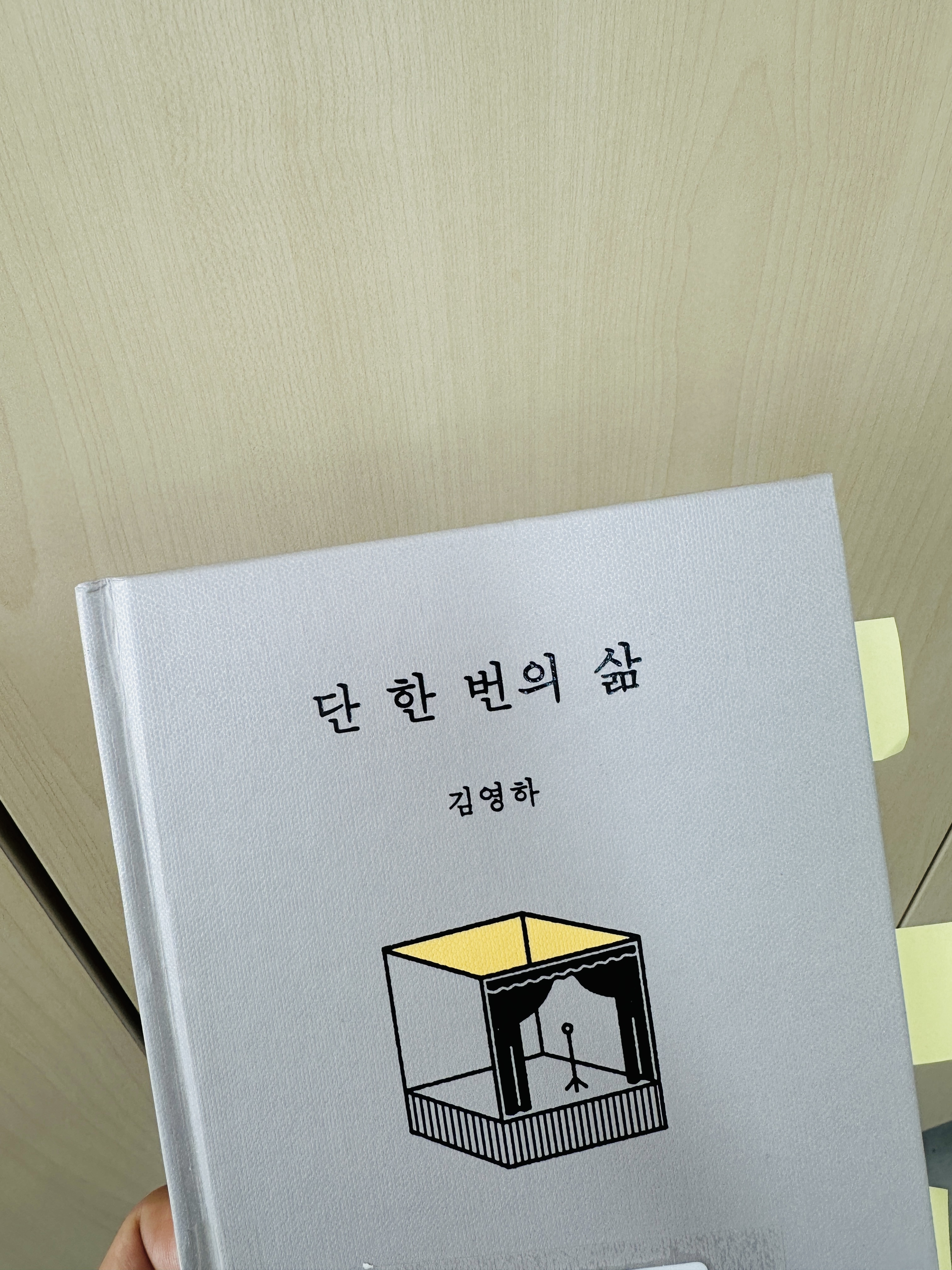
며칠 전 김영하 작가의 최신작 『단 한 번의 삶』을 읽었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문장이 낭독하듯 쉽게 책장을 넘기게 했다. 집요한 기억력과 관찰력, 적당히 과하지 않게 현학적이고 철학적인 성찰은 책을 읽는 재미를 더했다. 책의 차례만 읽으면 모던한 느낌이 무슨 철학적 변증을 담고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작가의 가족과 자신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다. 특히 중년 아들의 시선으로 부모의 삶을 반추하며 쓴 부분은 눈시울을 뜨겁게 한다. ‘부모’라는 단어만 들어도 마음속에 이는 복잡한 감정들,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라서 가장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기막힌 모순, 상처받고 이해받지 못해서 서운하다가도 마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모와의 애증관계. 김영하 작가도 나와 같은 시대를 살았으니 결국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도 당연했다. 작가는 말한다. 우리는 모두 '조용한 절망'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치열한 삶'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나는 외갓집에 갈 때마다 다락방에 틀어박혀 배를 깔고 그 책들을 읽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월든』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조용한 절망 속에서 살아간다”고 썼고 이는 그의 글 중에서 자주 인용되는 문장 중의 하나다. 소로의 시대, 뉴잉글랜드 시골의 미국인들이 어땠는지는 모르겠으나, 나의 엄마, 아버지, 그리고 외속모 같은 분들은 ‘조용한 절망’에 잠겨 살지 않았다. 원래 나는 ‘인생 사용법’이라는 호기로운 제목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내가 인생에 대해서 자신 있게 할 말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저 내게 ‘단 한 번의 삶’이 주어졌다는 것뿐, 그리고 소로의 단언과는 달리, 많은 이들이 이 ‘단 한 번의 삶’을 무시무시할 정도로 치열하게 살아간다는 것이었다. p.197
2. 테세우스의 배
책을 읽다가 「테세우스의 배」라는 꼭지에서 시선이 멈췄다. ‘테세우스의 배(The Ship of Theseus)’란『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나오는 이야기다.
"테세우스와 아테네 청년들이 크레타에서 돌아온 배에는 서른 개의 노가 달려 있었고, 아테네 사람들은 데메트리오스 팔레우스의 시대까지 이 배를 유지 보수했다. 썩은 널빤지를 떼어내고 새롭고 튼튼한 목재를 그 자리에 덧대어 붙이기를 거듭하니, 이 배는 철학자들 사이에서 ‘끊없이 변화하는 것들에 대한 논리적 질문’의 훌륭한 본보기가 되었다. 어떤 이들은 그 배가 변함없이 그대로라고 주장했고, 어떤 이들은 배가 다른 것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 『플루타르코스 영웅전』,「테세우스의 생애」
"The ship wherein Theseus and the youth of Athens returned from Crete had thirty oars, and was preserved by the Athenians down even to the time of Demetrius Phalereus, for they took away the old planks as they decayed, putting in new and strong timber in their places, insomuch that this ship became a standing example among the philosophers, for the logical question of things that grow; one side holding that the ship remained the same, and the other contending that it was not the same."—『 Plutarch』, 「Life of Theseus」

김영하 작가는 ‘테세우스의 배’에 빗대어 인간은 행동, 마음, 습관은 조금씩 달라지다가 그 변화가 누적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한다. 우주 만물이 그러하듯 인간은 얼마든지 변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변론이다. 작가는 그 예로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십 대와 삼십 대에 술과 담배가 일상이었던 자신의 경험을 얘기했다. 도시를 좋아했던 감성은 자연취향으로 변하였고 좋아하는 작가, 자주 듣는 음악, 즐겨 먹는 음식도 모두 변하였으니 한 마디로 왜 그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십 대의 내가 만났다면 재수 없어했을 사람으로 변한 것 같다’고 말한다. 사람 속이야 모르겠지만 작가의 글을 읽다 보면 그런 변화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게 된다.
여기저기 조각을 덧댄 것이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가 맞냐는 답은 대상의 ‘본질’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의 몸은 7년을 주기로 모든 세포가 완전히 새것으로 바뀐다고 한다. 교체된 세포를 쉽게 말해 덧댄 조각이라고 한다면 세포만 바뀌었을 뿐 7년 전의 나와 7년 후의 나는 다른 사람이 아니듯, 테세우스의 배는 덧댄 조각과 상관없이 정체성은 늘 동일할 것이다. 수많은 뉴런의 상호작용이 인간의 정신을 그대로 계승하여 연속성을 유지하듯 배의 정체성도 계속 이어지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에 반대할 지도 모르겠다. 덧댄 조각을 수없이 또 교체하다가 배의 원형을 잃는 지경에 이르러도 그 배는 테세우스의 배일까? 아니면 덧댄 조각을 다시 모아 또 다른 배를 만든다면 그것이 테세우스의 배가 될 수 있을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누군가 테세우스의 배라고 계속 인식하고 그 인식이 합의에 이르렀다면 그것은 여전히 '테세우스의 배'라는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런데 인식의 합의에 실패하면 덧댄 조각은 그저 덧댄 조각으로 전락한다. 수많은 침략에 항거해 온 우리 민족이 그간 수많은 북방민족의 이주로 혈연의 순수성이 사라졌음에도 ‘단일민족’이라고 심증적으로 주장하는 것이나 민주적 합의라고 이름한 민주적이지 못한 역사 속의 수많은 작위적인 합의가 그런 예일지 모르겠다.
김영하 작가는「테세우스의 배」에서 오히려 ‘변화보다 더 어려운 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도발적 사건’에 의해 인물의 변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만물이 그러하고, 자신이 그러하듯 아무 이유가 없어도 인간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다고 말이다.
굳이 진화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자연은 순수를 혐오하며 세상은 변화하는 것들만 살아남는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테세우스의 배’이상으로 변화무쌍하다. 변화는 때로 불편하고 불쾌하지만 자연의 순리임에는 틀림없고 그 결과가 꼭 나쁜 것 만도 아니다. 경계해야 할 것은 ‘사람 고쳐 못쓴다’는 말과 같은 섬뜩한 생각일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내가 오히려 ‘고쳐 못쓸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변화는 다른 말로 '넓어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 세상을 한 발 떨어져 거시적으로 보는 느낌말이다. 오늘도 세수를 하며 거울 속의 나를 흠칫 바라본다. 얼굴의 각질이 떨어지는 것을 보니 내 스스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 몸은 순순히 새로운 변화를 받아드리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문득 의문이 생겼다. 지금의 ‘나’는 어제의 ‘나’일까?
'극히 사소한 독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윤성희, 『느리게 가는 마음』 (1) | 2025.11.07 |
|---|---|
| 양귀자, 『모순』 (1) | 2025.10.31 |
| 제임스 조이스, 『젊은 예술가의 초상』 (1) | 2025.09.25 |
| 오스카 와일드,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 1890』 (1) | 2025.09.23 |
| 한강, 《소년이 온다》 : 7개의 이야기 (0) | 2025.09.22 |



